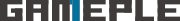전사, 모험가, 상인 세 성향과 다양한 직업 및 어빌리티 존재
유저 간 상호작용 극대화... 당시 국내 MMORPG 중 가장 독특해
클래식 RPG 부활 분위기, 업데이트 올라올 날 기다리며

[게임플] 항상 대(大)자로 뻗어 있는 깡마른 팔다리에 해골 머리. 이 보잘것없는 캐릭터가 너무도 소중했던 시절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중학생 때의 이야기다.
기자의 첫 MMORPG는 넥슨의 ‘일랜시아’였다. 1997년 출시되어 현재까지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는 넥슨의 ‘클래식 RPG’ 중 하나다. 하지만 ‘바람의 나라’나 ‘테일즈위버’ 같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 그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도 그럴 것이, 2014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완전히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2016년 클래식 RPG의 부활 소식이 들리고, 어둠의 전설과 아스가르드의 업데이트가 재개됐을 때는 함께 기뻐했다. 일랜시아도 언젠가는 업데이트가 다시 진행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일랜시아의 업데이트 소식은 없었다. 마치 수족관 속 물고기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세계 속을 떠도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토록 이 게임에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돌이켜 보면 일랜시아는 사춘기 시절 삶의 절반이었다. 현실의 ‘나’가 있다면, 일랜시아엔 가상의 ‘나’가 있다. 현실의 ‘나’와 마찬가지로, 가상의 ‘나’는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성장’했다. 말하자면 당시 게임 중에서 MMORPG의 매력을 가장 잘 살린 게임이었다.

일랜시아엔 ‘전사’, ‘상인’, 그리고 ‘모험가’까지 총 세 가지 성향이 있다. 각 성향에 맞는 직업이 있고, 직업에 맞는 ‘어빌리티’도 있다. 일랜시아는 몬스터를 잡고 경험치를 얻어 성장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광산에서 광물을 찾아 캐고, 바다에서 낚시하고, 요리를 비롯한 각종 유용한 아이템을 만드는 등 모든 어빌리티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개인적으로 모험가 성향 어빌리티를 정말 좋아했다. 필드 위에 몬스터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세계를 모험하며 값비싼 아이템을 찾는 게 정말 재밌었다. 그래서 광산과 낚시터를 떠돌며 보석을 캐고 물고기를 낚았다. 물론 이를 통한 성장은 무척이나 더디기 때문에 항상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빌렸다.
당시에는 새싹 모자 아이콘의 ‘하이드 매크로’가 유행했다. 특정 키와 마우스 입력을 자동으로 반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사냥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빌리티 성장엔 이 매크로가 필수적이었다. 어빌리티는 최대 100까지 올릴 수 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어빌리티를 올리는 데 필요한 행동의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이다.
100번 넘게 시도해야 0.01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24시간 내내 매크로를 돌려 캐릭터를 성장시키곤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소위 ‘분재’라 불리는 게임과 다를 게 없다. 그래도 확인할 때마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험치를 보면 기분이 좋았다. 어린 시절엔 ‘나도 이렇게 성장하고 싶다’는 막연한 동경도 있었던 것 같다.
일랜시아의 시스템은 복잡하다. 어빌리티를 올리면 해당 직업의 ‘잡포인트’가 오르고, 잡포인트가 오르면 캐릭터의 능력치에 변화가 생긴다. 이게 직업마다 오르고 내리는 수치가 천차만별이고, 직업의 가짓수도 26개나 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직업을 오가면서 필요한 능력치를 올려, 능력치를 최대치로 높이는 작업을 ‘루트’라 불렀다.

이 과정이 워낙 길고 복잡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 어빌리티를 올리는 과정에서 매크로를 돌리며 커뮤니티에서 유저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일랜스쿨’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가장 유명했고, 유저들은 이곳의 카페 채팅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따금은 상업의 중심지인 알파 로랜시아 광장에 모여 크고 작은 이벤트를 여는 등 유저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함께 즐겼다.
당시 기자는 음유시인을 키웠다. 류트 연주와 함께 정령의 힘이 담긴 특별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직업이다. 딱히 유용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스킬 이펙트가 주변에서 터져 나오는 모습이 제법 멋있었고, 무엇보다 음악으로 특별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그 컨셉이 너무 좋았다.
마을 광장 한복판에서 광대를 자청하며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류트를 연주하기도 하고, 사냥터 입구에서 사냥을 하러 나온 유저들에게 버프를 제공하기도 했다.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지만, 다른 유저의 호응과 감사 인사가 마냥 좋았다.
14년이 지난 지금도 MMORPG라면 사족을 못 쓰고, 여전히 음유시인 컨셉 직업을 가장 좋아한다. 인생 첫 사기도 일랜시아에서 당했으며, 글을 쓰는 방법도 함께 게임 했던 유저들로부터 배웠다. 즉 지금 삶의 많은 요소를 영글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게임이 바로 일랜시아다.
지금도 간간히 일랜시아 홈페이지를 찾아가곤 한다. 언젠간 이 인적 드문 곳에 새로운 손길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몇 년째 묻어둔 타임캡슐을 잊지 않고 꺼내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고 다시 홈페이지를 기웃거리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 '발로란트' 대 '서든어택', FPS '신구 대결'... 올 여름이 분수령
- '데이브 더 다이버', 스팀 최다 동접 5만 돌파... "이젠 넥슨도 못 말린다"
- 메이플 '하이퍼 버닝' 후 2주... 다음 장벽은 '유니온 시스템'
- '던파'의 여름이 편안한 이유, 시원하게 개선된 '유틸리티'
- e스포츠 지역 연고제, 지역 불황과 팀 적자 구해낼까?
- 글로벌 흥행작 '데이브', 매출보다 귀중한 것 얻은 '넥슨'
- '데이브' 물 들어온 민트로켓, 다음 게임의 개발 비밀은?
- "우리 뉴비를 지켜줘" 검은사막, 신규 유저 보호 위해 강경 대응
- '블루 아카이브', 8월 3일 중국 출시... "2차 창작 페스티벌도 참가"
- "서버를 늘려도 꽉 차요"... '검은사막' 유저 폭증 비결은?
- "서비스 1만 일 이벤트?" 넥슨 클래식 RPG, 지금도 '현역'
- 20주년 '테일즈위버', 그 기록에 새겨진 추억담
- 서비스 1만 일 ‘바람의 나라’, 故 김정주가 그린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