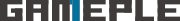플랫폼의 차이를 간과한 끊임없는 도전, 언제까지?

[게임플] 지난 2013년 게임 툼 레이더가 리부트된 것에 이어, 오는 3월에는 영화 툼 레이더도 리부트돼 개봉한다. 게임을 원작으로 했던 영화 툼 레이더 시리즈는 안젤리나 졸리라는 파격적인 캐스팅에 힘입어 흥행을 이뤘다. 하지만 그뿐,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쌍권총을 들고 다니는 안젤리나 졸리지, 전반적인 툼 레이더의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영화의 홍보도 바뀐 배우인 알리시아 비칸데르에 중점을 뒀을 뿐,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부각되는 홍보가 없다.
이러한 게임의 영화화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들을 보았을 때, ‘하지 않았으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예전부터 게임의 영화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 슈퍼 마리오라는 인기 IP를 차용했음에도 ‘괴작’으로 불렸던 영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부터 시작해, 지난 2016년 개봉했던 어쌔신크리드까지. 흥행한 게임은 그 이름만으로 강한 IP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탐을 내지만, 사실 성공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툼 레이더나 레지던트 이블과 같은 영화도 존재하지만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는 흥행을 떠나 관객들, 특히 게임의 원작 팬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다.
게임을 영화화한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은 2016년 개봉해 현재까지 4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허나 영화, 게임 등의 리뷰 집계 사이트인 메타크리틱에서 얻은 점수는 32점(최대 100점)에 불과했다. 수익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나왔으며, 북미와 우리나라에서는 참패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가 흥했음에도, 불과 200만 명을 넘지 못했다.
물론 CG나 여러 배경 연출, 묘사의 관점에서 장점이 있긴 하지만 탄탄한 세계관과 스토리가 장점인 워크래프트이기에 그 정도 만듦새에서 영화를 멈춘 것이 문제였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게임과 영화라는 플랫폼 차이에서 오는 피로감과 시간적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영화는 보는 관객이 제 3자다. 하지만 게임은 즐기는 유저 자신이 주인공이다. 여기서부터 피로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게임은 자신이 그 세계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대사, 정보, 인물들이 등장하면 쉽게 혼란이 오고, 피로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현실에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게임을 플레이했는데,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진다면 더 피로감에 쌓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게임의 형태는 캐릭터, 액션,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유저가 알아야 할 정보에 있어서는 ‘큰 줄기’를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큰 줄기만을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지다 보니, 영화 곳곳에 허점이 발견되는 것은 당연하다. 유명 작가, 연출진이 머리를 맞대어 구상하겠지만, 스토리를 추가적으로 넣자니 원작 팬들의 반발이 있고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보니 스토리 상의 공백이 생기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게임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는 캐릭터, 액션 등 눈요기에 치중되는 경향이 크다.
반대의 경우인 ‘방대한 스토리를 가진 게임’을 가져와도 문제는 발생한다. 예컨대 여러 시리즈를 출시하며 흥행했던 게임 어쌔신크리드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 암살단과 템플 기사단이라는 허구의 존재를 넣어 만든 팩션(Faction)이 주된 스토리다. 그만큼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방대한 스토리를 지닌 게임인데, 이를 담은 영화 어쌔신크리드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에덴의 조각, 암살단, 애니머스 등 여러 중심적인 이야기는 배치했지만, 이야기들이 빠르게 전개되다 보니 부각된 건 파쿠르와 같은 액션뿐인 것이다. 그렇다 보니 원작을 아는 관객은 아쉬움을 내뱉고, 모르는 관객은 영화 스토리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소 십여 시간은 플레이해야 하는 게임과 많아야 서너 시간으로 한정되는 영화의 시간적 차이가 가져오는 문제다. 많게는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게임의 이야기를 영화 러닝타임 내에 넣으려다 보니 원작을 모르는 관객을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영화의 완성도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한정적이라는 것도 이 문제에 포함된다. 단순히 게임의 명성만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다 보면, 원작 팬들이야 의리로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의 영화인가’라고 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우겨넣을 건 다 넣었으니, 원작 팬들은 알아봐 줄 거야’라는 심정으로 연출을 하는 영화는 되려 양쪽 모두에게 쓴소리를 듣게 된다.
올해에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영화화 재도전 등 게임의 영화화가 지속될 예정으로 보인다. 현재 출시 후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몬스터헌터: 월드의 시리즈인 몬스터헌터도 영화로 제작될 것이라 2016년 도쿄 게임쇼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게임의 영화화가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임을 영화화함에 있어 그저 흥행에 급급해 제작을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게임이라는 플랫폼이 ‘문화산업의 정수’라고 불리는 만큼, 그 시장 사람들의 수준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에 그 이상, 게임 시장의 유저가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게임의 내용만을 영상으로 담아낸다면, 유저 입장에서는 게임 내 영상을 보는 것만도 못하다. 예컨대,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와 같이 흥행한 ‘소설’을 시리즈에 걸쳐 오랜 기간 영화로 보여주었듯, 게임영화도 단순히 ‘오락물’ 영화 제작이 아닌 한층 더 수준 높은 창작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고민 없이, 그저 구 시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상업, 오락적인 성향으로 게임이 영화화 되는 것은 사양이다. 잘되고 못됨이란 흥행을 떠나 ‘부관참시’ 되는 행보로 보여지기에 이제는 그만됐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인 것이다.
관련기사
- 웹툰 IP 기반 게임, 모두를 아우를 수 있어야
- 게임이 전통을 선도할 수 있을까?
- 우주최강 전설급 '공돌이'들
- 게임과 영화로 보는 캐릭터 정신분석
- '파판의 영화화' 스퀘어에닉스의 무한도전 스토리
- '영화 같은 게임'의 영화화, 원작의 명성 이어갈까
- 게임 속 도덕성 '약 인가 독 인가'
- 아재들이 점령한 '10조원의 게임시장'
- 중세 유럽의 경제와 게임의 역학관계
- 핵 전쟁을 보는 게임의 시선
-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으로 보는 게임의 본질
- 다시 시작되는 모험 ‘쉐도우 오브 툼레이더’, 한글화 확정
- ‘다음 무대는 그리스?’ 유비소프트 신작 어쌔신크리드: 오디세이 공개
- ‘몬헌이 3D 애니메이션으로’ 캡콤, 몬스터헌터: 레전드 오브 더 길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