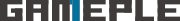게임산업에 부는 중국發 한파, 산업보호 정책 절실한 게임사들
[게임플] 중국 게임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한파에 전세계 게임시장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중국 게임시장에서 전해오는 연이은 악재에 올해 전세계 게임시장 예상 매출도 하향됐을 정도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뉴주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게임시장 매출 규모는 종전 에상치인 1,379억 달러(한화 약 155조 원)에 못 미치는 1,349억 달러(한화 약 151조 5천억 원). 중국 시장의 판호 발급 중단과 일명 '게임시간 총량제' 도입이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중국 내 내자판호 발급 중단, '게임시간 총량제' 도입이 지난 8월에 시작됐다. 단 몇개월 만에 전세계 게임시장 연간 매출액이 중국시장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 시장이 산업군에서 얼마나 큰 규모를 지닌 시장인지를 입증한다.
전세계 게임시장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이 전해지는 와중에 한국 게임산업은 이 충격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 단지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확히 한국을 타겟으로 '불공정 무역'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 주도 하에 이런 상황을 타개할만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한국 게임산업을 더욱 힘겹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한국 게임산업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중견게임사들은 중국발 악재에 유독 큰 타격을 받았다.
미르의 전설 IP로 중국시장을 개척했던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뮤 IP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하며 한국 게임시장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던 웹젠은 모두 사드 정국에서 이어진 '한한령' 이후 직격타를 맞은 대표적인 게임사들이다.

중견게임사 뿐만 아니라 대형 게임사들 역시 중국發 악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판호발급 중단이 신작게임 출시 길을 막았다면 8월 말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중국 내 '게임시간 총량제'는 그간 중국에서 서비스 중이던 게임들의 앞길을 막아설 규제 정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외 시장조사 업체에서는 당장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등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外 게임'의 매출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 내 내자판호 발급이 중단되며 자국 시장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된 중국 게임사들이 한국시장을 타겟으로 게임을 출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자칫 한국시장이 중국 게임사의 테스트베드가 될 여지도 있다.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한국게임을 무분별하게 베끼는 중국 게임산업의 행태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 게임사가 중국 퍼블리셔와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중국 시장 내 '짝퉁게임'에 대한 관리권한을 일임하는 경우에는 다소 안심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게임들은 여전히 언제든 중국 게임사의 표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게임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 게임사의 '한국행 러쉬'를 제어하고, 국내 중소게임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진출을 도와주는 것은 됐으니 국내 시장 보호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렇다 할 정책도,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올해 2월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방송 부서를 팀에서 본부급으로 격상하며 게임산업 보호와 진흥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이런 기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게임산업을 더욱 압박하는 모습이다. 지난 10월에 진행된 2018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치권의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게임산업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시선만 드러났다. 지지부진한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정책을 지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중국에서 전해진 연이은 악재에 전세계 게임산업이 타격을 입는 모습이지만, 그 중에서 한국 시장이 유독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 발단이 산업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다.
혹자는 중국 시장에 대한 한국 게임산업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일견 맞는 이야기다. 실제로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더욱 집중했던 게임사들은 중국시장 진출이라는 기회를 잃기는 했지만 실질적 타격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현 상황의 책임을 게임산업 전반에 떠넘기는 것은 이런 지적이 옳은지 틀린지와는 무관한 이야기다. 특히 국가 주도하에서 난국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무관하다.
게임업계가 국가의 주도 하에 중국의 빗장이 지금 당장 열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를 위한 시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안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기사
- 텐센트, 자사 게임 전체에 실명 인증 시스템 도입
- 중국發 악재에 세계 게임시장 매출규모 하향 조정
- 중국, ‘그린채널’마저 중단… 사실상 게임 차단
- 자국시장 막힌 중국 게임사, 빗장 열린 한국시장 총공세
- 텐센트 주가 급락, 6년 만에 구조 조정 '정점 찍었나'
- 중국 '게임시간 총량제' 불똥, 한국 게이머에게 튀었다
- 505게임즈, "중국 정부는 게임산업에 관심이 없다"
- 닌텐토 후루카와 사장, "중국 시장 진입,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 [시선 2.0] 다시 시작되는 ‘中 짝퉁 게임 공습’… 내실 키워야
- 위메이드, ‘2019 미르의 해’ 위한 디딤돌 마련했다
- 中 판호 심사 재개 되나? 기대감 커지는 한국 게임산업
김한준 기자
khj1981@game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