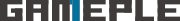"이건 한국 게임인가?", "중국 게임인가?" 등 감정적 논쟁 잇따라
서구권 기준으로는 개발 스튜디오 국적... "LoL도 미국 게임 맞아"
갈수록 국적 구분 무의미해질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는 중국 게임 아닌가?"
가끔씩 'LoL'에 대한 갑론을박이 시작될 때 종종 보이는 말이다. 특히 한국이나 중국이 얽혔을 경우 국적을 따지는 논쟁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이건 한국 게임은 아니지 않느냐", "당연히 한국 게임 아니냐" 등 최근 신작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흔해졌다.
LoL이 주로 화두에 오르는 이유는 국내 최고 인기 게임의 위치, 그리고 독특한 포지션 때문이다. 라이엇 게임즈 본사는 북미 법인이지만, 지분은 중국 기업 텐센트가 모두 소유하고 있다. 텐센트는 게임 출시 시점에 투자를 통해 라이엇을 합병했고 현재 LoL 중국 서버 운영을 독자적으로 하는 중이다.
이런 일은 점점 흔해지고 있다. 자본이 국가를 초월해 글로벌 시장을 넘어다니면서다. 예컨대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 볼보는 승용차 부문이 중국 지리자동차 소유가 됐고, 모델 상당수는 중국 공장에서 중국인들이 제작한다. 다만 본사 위치와 브랜드 철학은 여전히 스웨덴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의견은 항상 분분하다.

■ 결론부터 말하면, 개발 스튜디오의 국적이 주요 기준이다
게임 쪽은 어떨까. 서구권은 비디오 게임 초창기에 이미 거쳐간 길이다. 개발 규모가 크지 않던 시기는 국가별로 개발팀과 게임 문화가 나뉘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온라인 시대 진입 이후 흐려졌다. 북미와 유럽으로 구분한 시기도 아주 잠깐 있었지만, 결국 영어권은 하나의 교류를 이루게 됐다.
다만 서양과 일본 게임 사이에는 구분이 있었다. 개발진이 확실히 갈려 있었고 작품 방향성도 달랐다. 업계 사이 경쟁심 역시 존재했다. 2010년대 초중반 일본 게임이 한창 힘을 쓰지 못할 시기, 이를 부각해 비꼬는 서양 개발자들의 멘트가 화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당시 구분 기준을 살피면 답도 정해져 있다. 보통 개발 스튜디오의 국적을 따른다.
일본 기업이자 PS 플랫폼홀더인 소니가 대표적이다. 거대 콘솔을 쥐고 있는 만큼 퍼스트파티로 서구권 알짜배기 개발진을 대거 인수한 바 있다. 2001년부터 인수된 너티 독을 비롯해 산타모니카 스튜디오, 사커 펀치, 게릴라 게임즈가 대표적인 소니 자회사들이다.

'LoL'을 중국 게임으로 분류하려면 '언차티드나' '라스트 오브 어스' 시리즈, '갓 오브 워', '스파이더맨' 등 수많은 게임을 모두 일본 게임으로 취급해야 한다. 위 게임들은 소니가 적극적으로 유통,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기 때문에 관계성이 더욱 크다. 하지만 세계 공통으로 서양 게임이라고 부른다.
같은 기준이라면, LoL은 미국 게임이 맞다. 라이엇 본사는 철저하게 현지 개발자로 구성됐으며 게임 개발 및 운영도 독립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외 운영 역시 중국을 제외하면 각 지역의 라이엇 지사가 담당한다. 물론 글로벌 행사는 텐센트의 의중이 전혀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겠지만, 게임 운영에 관여하진 않기 때문에 기준은 명확하다.

■ "어디까지가 한국 게임인가"의 답도 내릴 만하다
한국도 이런 경계선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위해 해외 업체와 개발진을 여럿 인수했고, 결과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 넥슨이 인수한 스웨덴 개발사 엠바크 스튜디오의 '더 파이널스'가 이런 사례에 속한다.
같은 기준이면 더 파이널스는 한국 게임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넥슨 게임'이라는 분류는 하지만 굳이 국적을 부여하진 않는다.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도 비슷하다. 해외 반응 역시, 두 게임과 'Korean Game' 등의 키워드를 연결해 조사할 경우 유의미한 논의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이론의 여지 없이 한국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나 '퍼스트 디센던트', 'P의 거짓' 등 글로벌 화제작은 관련 키워드가 자주 보인다. 한국 게임 현황에 대해 토의하는 레딧 글이나 성장을 주목하는 영어권 매체 기사가 대표적이다. 굳이 국적을 구분해야 할 경우라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가는 것이 맞아 보인다.

■ 하지만, 국적 구분 의미가 없어지는 방향이 옳다
단, 게임 국적에 관해 이런 분석이 무의미해질 날이 곧 다가올 수도 있다. 한국 게임업체가 글로벌 기반을 마련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진다. 개발진도 서로 섞이는 추세다. 앞서 언급한 더 파이널스 역시 한국인 개발자 일부가 참여하고 있고, 해외 자회사간 인력 이동은 점차 활발하다.
최근 가장 복잡한 사례는 크래프톤의 '눈물을 마시는 새'다. 캐나다 법인으로 몬트리올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해외 개발진을 주축으로 초기 개발 중이다. 하지만 한국 원작 소설로 개발하는 한국 IP이기도 하고, 초기 기획은 크래프톤이 직접 주도했다. 이쯤 되면 한국 게임인지를 가릴 의미가 없는 다국적 프로젝트다.
내수 게임 개발이 워낙 탄탄한 일본과 폐쇄적 시장을 유지하는 중국은 사례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그 형태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 지금 서구권 게임계 대부분이 그렇듯 최대한 열어두고 전체 생태계에 녹아드는 방향이 정석으로 자리잡게 되지 않을까.
특정 게임 몇몇의 흥행이나 부진으로 한국 게임의 흥망을 논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보다 업체 규모와 시장 규모, 전반적인 업계 근무환경을 놓고 이야기해야 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핵심 관건은 한국 게임 여부가 아니라, 게임이 한국 유저들에게 얼마나 즐거운 경험을 주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