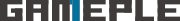개막 전의 불안감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게임플]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의 첫 번째 공식 e스포츠 프로리그인 '펍지 코리아 리그'(이하 PKL)이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배틀그라운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며 국내 게임시장의 화제로 떠오르자 자연스레 대중의 관심은 '이 게임이 e스포츠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로 몰렸다. 스타크래프트, 리그오브레전드 등 국내 e스포츠 시장을 대표하는 '간판'은 항상 있었지만, 시장 다양성 측면에서는 늘 아쉬움이 있었던 e스포츠 시장의 새로운 흥행요소가 될 게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게임의 흥행과 e스포츠 판도의 특수성 때문에 큰 기대를 받으며 시작된 PKL이지만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행보가 마냥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느린 템포로 게임이 진행된다는 점, 20개 팀, 선수 80명이 한 번에 경기에 참가하는 게임 특성을 살린 중계 시스템 구축이 미지하다는 점 등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e스포츠 종목으로 적합한가를 두고 논쟁이 펼쳐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운이 승부에 너무 크게 작용된다는 점도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가 이벤트 매치가 아닌 '공식 리그'에 부적합하다는 평을 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결과만 말하자면 리그 개막 전의 이러한 우려는 시즌이 끝나는 지금까지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더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예상됐음에도 각각의 문제가 개선되는 모습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반에 느릿느릿하게 파밍을 하다가 자기장 좁혀질 때마다 선수들이 우르르 탈락하고, 이런 것이 몇 번 반복되다가 마지막 5분을 남겨졌을 때 각 팀의 선수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양상이 매 경기 반복됐다.
매번 비슷한 경기가 펼쳐진다는 점은 관중들에게 지루함을 줬다. 선수들이 우르르 탈락하는 와중에 관중들은 '어떤 선수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행동을 하다 탈락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관중들이 경기에 몰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장면을 유저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설자들의 코멘트를 듣고 정보를 습득하다보니 '문자중계를 보는 듯 하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게임의 특성 뿐만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큰 아쉬움을 남겼다. PKL 하나를 위해 비슷한 리그가 3개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선수들을 지치게 만들었으며, 중계 중에 빈번하게 드러나는 버그와 게임 지연은 리그의 완성도는 물론 게임의 완성도까지 의심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간의 비판이 리그 뿐만 아니라 펍지를 향하기도 했다. 얼리 억세스 기간 초반만 하더라도 펍지 측은 e스포츠 가능성을 묻는 미디어의 질문에 '게임의 완성도를 신경 쓰는 것이 우선이다. e스포츠는 그 이후에 구상할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즉, 배틀그라운드 공식 리그가 시작됐다는 것은 게임의 완성도가 일정 궤도에 올랐다는 뜻도 함의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리그 진행 중에 게임의 완성도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리그 내에서도, 게임을 개별적으로 즐기는 유저들 사이에서도 말이다. 두 마리 토끼를 따르다가 둘 다 놓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PKL의 첫 번째 시즌은 배틀그라운드의 e스포츠 흥행을 위해 펍지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한다는 현실적인 숙제를 남겼다. '공식 리그'였지만, 그 진행 과정이나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때 '시범 리그'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과연 펍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PC방 시장에서 리그오브레전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배틀그라운드가 e스포츠 시장에서도 최대 인기 종목으로 자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