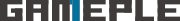아직 전반전에 불과, 후반전 갈수록 쏟아질 재미도 엿보여
전작 훌륭함은 모두 계승하면서 발전시킨 시스템 기틀

[게임플] 영화의 절반만 감상하고 평가를 내리는 건 어려운 일이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한참 앞서 플레이를 시작했지만, 디아블로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다.
'디아블로 4'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다른 형제들의 탁월함만 취했다. 그리고 앞으로 빠져나갈 구멍까지 모색했다. 블리자드는 대악마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치밀한 모략을 세웠고, 적중했다. 지금 디아블로와 맞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디아블로 초기의 기괴함과 공포는 확실히 돌아왔다. 처음 만났던 아트워크와 디자인이 당시 기술의 한계로 만들어진 우연이었다면. 디아블로 4는 의도된 기괴함과 공포를 선보인다. 이번 작품의 미장센은 성역의 암울한 이야기와 아주 잘 어울린다.
월드와 던전에서는 코스믹 호러 장르와 유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고딕풍의 대성당과 던전 구조는 압도적 분위기를 선사한다.

몬스터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다. 에이리언 시리즈와 데드 스페이스를 좋아하는 유저들에게는 익숙한 디자인으로 변형됐다. 기존 디아블로 시리즈에 친숙했던 몬스터들이 기괴한 악마로 다가오는 공포는 남다르다.
디아블로 4의 키 아트와 스틸 컷을 살펴보면 그 의도를 확연히 알아볼 수 있다. 르네상스 미술에서 환시 미술, 코스믹 호러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르에서 영향을 받았다. 알 수 없는 존재에 의한 압도적이고 절망적인 공포와 악마와 천사의 대립이라는 경험을 선보이기 위해 실험적 아트워크들을 만들어 냈다.
이제는 많은 유저들이 블리자드의 ‘할리우드식’ 연출과 시네마틱 영상에 익숙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디아블로 4의 시네마틱 연출은 ‘에픽’하다. 시네마틱과 컷신 연출은 게임 전반부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다.
시네마틱 영상의 강렬한 감동은 디아블로의 다른 형제들, 'WoW(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3' 그 이상이다.

전투는 전작 이상이다. 기자는 오픈베타와 서버슬램에 이어서 다시 한번 야만용사를 선택했다. 지난 오픈 베타와 서버슬램 동안, 디아블로 4의 전투가 답답하고 최악이라는 해외 리뷰들은 모두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투는 재미를 더하며 전략적으로 변해간다. 전설 아이템 몇 개와 전설 위상이 생긴 후부터, 스킬 고유 능력과 전설 시너지를 고려한 딜 사이클을 계산해야 한다. 이 모든 게 제대로 맞물렸을 때 강력한 딜량을 뿜어낼 수 있었다. 이런 플레이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이보다 강력하고 재밌는 빌드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많은 기존 유저가 디아블로 시리즈의 유산 ‘부수고 써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알지만, 디아블로 4의 전투는 아이템과 스킬 간 전략과 연구를 요구한다. 다양한 유저 빌드가 성행하기 전까지 라이트 유저는 답답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부수고 써는’ 재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여전히 핵 앤 슬래시 장르의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외에 소서리스, 로그는 초반부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제약이 거의 없는 편이다. 전설 위상과 아이템이 추가될 때마다 강력해진다. 물론 초반부 플레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별 창의적 빌드와 재미에 대한 관련 코멘트는 어렵다.
후반부 엔딩 콘텐츠는 거의 즐기지 못했고, 새로운 시스템들을 익히는데 바빴다. 진지하게 연구할 시간은 부족했다. 50레벨 이상 정복자 구간은 다시 뜯어봐야 한다. 정복자 엔드 콘텐츠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전투의 재미를 느꼈다. 그러니 후반부 전투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내려놔도 된다.

디아블로 4에 혁신은 없다. 블리자드 태동기는 혁신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30년을 바라보는 게임 역사에 새로운 것을 선보인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디아블로 4는 전작과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선택을 내렸다.
상호작용 가능한 오픈월드로 변한 성역을 만나면서 처음 든 생각은 ‘왜 오픈월드일까?’였다. 디아블로 4는 쿼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다. 오픈월드 성역의 방대함은 지도를 열 때와 끊김이 없이 진행되는 연속성에서만 간혹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오픈월드의 장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장점으로 소개한 훌륭한 맵 디자인 부분에서도 아쉬운 맥락이다. 정말 훌륭한 미장센을 만들고도 쿼터뷰로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작진도 아쉬움을 느꼈는지 캠페인 중 몇몇 장소에서 백뷰로 카메라 워크가 움직이며 디아블로의 전경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뒀다.

디아블로 3 출시 초기의 기억이 떠올랐다. 던전과 필드 이벤트, 부가 퀘스트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숨겨진 제단과 명망 시스템으로 오픈월드를 탐험하게 하는 콘텐츠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수동적 동기에 불과하다.
그동안 숱한 게임들이 ‘오픈월드’의 공식을 제안했다. 더불어 오픈월드에 대한 유저 기준점은 매우 높아졌다. 유저들은 아주 세밀한 상호작용을 원하며 더 많은 가능성, 더 많은 퍼즐,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찾으려 한다.
악마들이 점령한 지역을 정화하고 다시 성역의 주민들의 거처를 만드는 보루 시스템은 너무 단순한 오픈월드 예시다. 부가 퀘스트 없이 상호작용 가능한 성역의 구역이 너무 적다는 것도 지루함에 한몫을 더 한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오픈월드 일부가 비어 있고 꽤 반복적이며 지루한 패턴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부가 퀘스트 진행을 멈추게 된다. 빠르게 필요한 던전들만 정복한 뒤 50레벨에 진입해 정복자 시스템과 엔드 콘텐츠를 즐기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전작에서 세션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정확한 목적과 동기를 갖고 성역에 임했던 유저들은 이런 시스템이 되레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픈월드는 특수한 아이템과 재화를 구할 수 있는 PvP 지역과 월드 이벤트 구역을 제외하고 거의 유기된 상태가 된다. 유저가 오픈월드를 즐길 수 있는 방식은 제단과 명망, 채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블로 4가 오픈월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능성과 확장성 때문일 것이다.
전작 디아블로 3에서 보여준 것처럼, 계속되는 업데이트와 시즌제 운영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채울 수 있고 유저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디아블로 형제 WoW와 마찬가지로 현재 공개된 성역을 중심으로 살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디아블로 시리즈는 그 역사에 비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성역의 구역이 많다. 제작진이 강조한 ‘라이브 서비스’ 내에는 분명 이런 패키지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지배할 디아블로 4의 서막을 아주 영리하게 설계한 것이다.

디아블로 4는 블리자드 IP의 존재감을 충분히 발휘한 게임이다. 그 만듦새와 단단함이 이전 시리즈를 넘어서고 있다. 시리즈의 방향도 분명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20년이 넘은 시리즈의 존속을 위한 후속작이 아니었다. 블리자드는 프랜차이즈 ‘테마파크’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디아블로를 제공했다. 이는 분명 시리즈 팬들의 박수를 받을 만하며, 모두가 다시 한번 성역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일이다.
블리자드는 다시 한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 디아블로는 유저들을 지옥으로 초대하지 않는다. 단지 귓가에 속삭일 뿐이다. 우리는 속절없이 그 제안에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