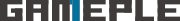이 정도면 천덕꾸러기 아닌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야 할 게임이 비인가 프로그램 문제로 이용자 수가 하락했다는 질책이 나왔다. 게임중독 혹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공중보건체계에서 대응 해야 한다고 한다.
이틀째를 맞이한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나온 게임 관련 이야기다. 하나 같이 게임산업에 대한 쓴소리다. 쓴소리를 들었으니 입맛이 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감에서 게임이 다뤄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게임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오가고 있으며,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인지는 이맘때 업계의 주된 관심사다.
아니. 정확히는 질의내용은 관심사가 아니다. 어떤 질문을 받을 것인지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때문이다. 지난 몇년 간 국감에서. 더 오랜 기간 정치권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고왔던 적이 없었다. 산업은 규제의 대상이었고, 산업에 몸 담고 있는 기업은 사안에 대한 원죄를 안고 있는 대상이었다.
규제를 이야기 할 수는 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아한 것은 왜 그 누구도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게임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개중에는 국익과 연결된 문제들도 있다. 해외 게임사들은 너무 쉽게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유한회사를 설립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게임 내 코드 변경으로 심의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했다. 특히 이런 기업들은 한국 게임시장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소게임사의 입지를 차지하며. 산업 경쟁력까지 해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 이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없다.

구글이나 유튜브,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의 국내 포털사이트와 동영상 스트리밍 산업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게임 산업은 이들 산업과 함께 4차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산업이다. 이러한 온도차이가 더욱 이해가 안 가는 이유다. 쏟아지는 규제안 갯수의 절반만큼이라도 진흥안이 언급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을까?
관련기사
- [시선 2.0] 영혼을 잃었다는 게임업계와 국감
- [시선 2.0] 과도한 게임 규제, ‘비행 게임’ 만들지도
- [시선 2.0] 추석과 성룡, 그리고 게임업체 이벤트
- [시선 2.0] 해외로 뻗어나가는 국산 e스포츠
- [시선 2.0] 천만관객 시대와 개발비 일천억 시대
- [시선 2.0] OGN의 ‘마지막 롤’, 결승전 그날의 분위기
- [시선 2.0] ‘잘 만든 게임인데’ 낙인에 고심하는 게임 업계
- [시선 2.0] 국내 게임 광고, 어디까지 왔나?
- [시선 2.0] 게임이 장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 ‘e스포츠는 게임?’ 우리나라는 e스포츠를 키울 생각이 있는가?
- [시선 2.0] 또 PC방 비극을 이용하려 드는가
- 2018 국감 참석하는 김택진 대표, 게임업계 입장 전달할까
- ICD-11과 확률형 아이템으로 긴장한 게임업계, 우려대로 흘러간 국감
- 자한당 윤종필 의원, 국감에서 'PC방 사건 원인은 게임중독' 주장
- [시선 2.0] 정치권 부정적 시선, 국감에서 정면돌파한 게임산업
- [시선 2.0] 듀랑고로 보는 넥슨의 이별 자세